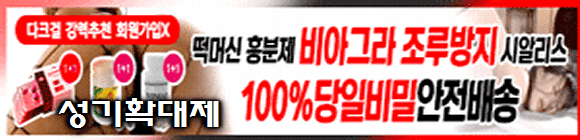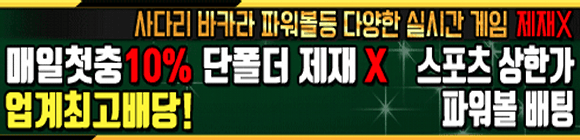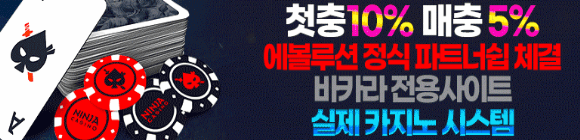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오타니 쇼헤이(BET365 먹튀·LA 에인절스)가 한 팀에서 뛸 수 있을까.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두 선수가 나란히 올스타전 출전을 노리고 있다.
작성자 정보
- 먹튀폴리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44 조회
- 목록
본문
프로야구 LG 트윈스 우완 투수 임찬규(BET365 먹튀)는 아쉬운 선수다. 2011년 신인 1차 지명으로 LG 유니폼을 입었을 때는 기대가 컸다. 뽀얀 피부에 순하게 생겼지만 마운드 위에선 시속 150㎞에 육박하는 빠른 볼을 던져 LG 팬들을 설레게 했다.
류현진과 오타니, 올스타전에서 한 팀으로?
하지만 기대만큼 쑥쑥 성장하지는 못했다. 2013년 말 팔꿈치 수술을 받은 뒤 구속이 시속 140㎞도 나오지 못하면서 에이스로 도약하지 못했다. 강속구 투수는 강속구에 미련이 많다. 임찬규도 강속구를 찾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매 등판 꾸준한 투구를 못 하고 기복이 심했다. 한 경기 잘하면 한 경기 무너지면서 마운드를 압도하지 못했다.
투구폼 교정 이후 평균 시속 140㎞까진 올렸다. 2018년에는 생애 첫 두 자릿수 승수(11승)를 올렸지만, 평균자책점은 5.77로 높았다. 그때까지 강속구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 그런 임찬규가 지난해에는 그 미련도 털어내고 기교파 투수가 되기로 했다. 제구에 집중했고, 체인지업을 주 무기로 활용하면서 10승을 기록했다. LG 국내 투수 중 가장 많은 승수였다. 평균자책점은 4.08로 2년 전보다 더 낮아졌다. 연봉도 1억3500만원에서 2억2000만으로 크게 올랐다.
임찬규에게 이제는 'LG 국내 선발투수 중 가장 잘 던지는' 수식어가 어울려 보였다. 그런데 다시 기복이 심해졌다. 지난 4월 두 차례 선발 등판해 모두 조기 강판했다. 그는 2패 평균자책점은 무려 21.21였다. 어깨 염증까지 겹치면서 지난 4월 25일 2군으로 내려갔다. 설상가상 지난 5월 19일 암 투병을 하고 있던 아버지 임영일 씨를 떠나보냈다. 심신이 모두 지칠 만했다. 언제 1군에 돌아올지 알 수 없었다.
그런 임찬규는 22일 SSG 랜더스와 원정 경기에서 두 달여 만에 1군 마운드를 밟았다. 그리고 7이닝 동안 1홈런을 포함해 2안타만 내주고 1실점으로 역투하며 올 시즌 첫 승리를 챙겼다. 신기한 것은 평균 시속 138㎞에 머물렀던 직구가 최고 시속 147㎞, 평균 시속 142㎞로 빨라진 것이었다. 우리 나이 30세. 신체 나이를 고려하면 이제 구속이 빨라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임찬규는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라고 했다. 그는 "(구속이 오른 이유를) 모르겠다. 상을 치르고 훈련했는데 저절로 구속이 올라왔다"고 표현했다. 아버지 임 씨가 남긴 유언은 이랬다. '쫓기지 말고 즐겁게 행복하게 야구하라'. 임찬규는 매 순간 강속구를 던져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지난 시즌 잘하면서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을 터였다.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서야 임찬규는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까. 그는 "이제 재밌게 행복하게 야구하고 싶다"고 했다. 앞으로 임찬규가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프로야구 베테랑 외야수 김강민(39·SSG 랜더스)은 대구중 시절 투수였다. "에이스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야구 명문 경북고에 입학했다. 그런데 1학년 때 크게 다쳤다. 손등뼈가 부러져 손에 힘을 줄 수 없었다. 경기에 나서려면 투수를 포기해야 했다. 내야 수비를 시작했다. 고3 때 잠시 투수를 겸업했지만, 2001년 SK 와이번스(SSG의 전신) 입단 후 1년간 내야수로 뛰었다.
그래도 투수에 미련이 남았다. 1년 뒤 결국 재도전을 결심했다. 직구 구속이 시속 140㎞대 중반까지 나왔다. 이를 악물고 노력하면, 투수로 프로 마운드에 설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2002년 2군 경기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 마운드에서 던진 공이 홈플레이트까지 가지 못하고 잔디에 떨어졌다. '너무 살살 던졌나' 싶어 힘을 줬더니 이번엔 포수 뒤 그물까지 날아갔다. 그게 '투수 김강민'의 마지막 경기였다.
이유 없이 '영점'이 잡히지 않으니 내야 송구도 어려웠다. 프로 3년 차로 접어들던 2002년 말, 김강민은 처음으로 '외야수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남들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했다. 외야는 예상보다 더 넓었다. 타구 판단조차 쉽지 않았다. 치열한 경쟁과 기약 없는 2군 생활도 몸과 마음을 괴롭혔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의 강한 어깨와 빠른 발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2005년 마침내 1군 주전 외야수가 됐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입단 후 포지션을 두 번 바꾼 김강민은 그렇게 외야수로 프로에서 살아남았다. 그냥 '생존'만 한 게 아니다. 수많은 타자가 김강민에게 홈런 혹은 안타를 도둑맞았다. 전 구단 감독과 동료가 "중견수 수비는 김강민이 KBO 1등"이라고 인정했다. 수비 잘하는 후배 외야수들은 앞다퉈 "김강민 선배가 롤모델"이라고 했다.
그런 그가 올해 한국 나이로 마흔이 됐다. 몇 년 전부터 경기 출장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올 시즌이 끝나면 SSG와 2년 계약도 끝난다. 은퇴를 고민해야 할 시기다. 그런데도 여전히 SSG 벤치에서 존재감을 뽐낸다. 잊을 만하면 나타나 '김강민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다.
메이저리그는 7월 14일(한국시각) 콜로라도 로키스의 홈구장인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올스타전을 개최한다. 아메리칸리그(AL) 9명(지명타자 포함), 내셔널리그(NL) 8명의 야수는 팬투표로 결정된다. 1차 투표는 25일까지 진행되고, 2차 투표(6월 29일~7월 2일)에서 선발출전 선수가 가려진다.
오래 버틴 덕에 학창 시절의 꿈도 이뤘다. 22일 LG 트윈스와 홈 경기에서 투수로 마운드에 섰다. 1-13으로 크게 뒤진 9회 초 1사 후, 다른 투수들의 힘을 덜어주기 위한 '땜질 등판'이었다. 김강민은 언제나 그랬듯 최선을 다했다. 정면승부를 하다 홈런을 맞았고, 곧바로 시속 145㎞ 직구를 던져 삼진을 잡았다. 단 한 순간도 야구를 허투루 대한 적 없는, 베테랑 선수의 '최선'이었다.
SSG 팬들은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고 더그아웃으로 돌아오는 김강민을 기립박수로 맞이했다. 익숙한 장면이다. 김강민은 종종 믿기지 않는 호수비로 기립박수를 받곤 했다. 다만 이번엔 이유가 조금 달랐다. 그건 그냥 '김강민'이라는 이름의 선수를 향한 존경과 경탄의 박수였다.
누구나 김강민처럼 선수생활을 하면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다. '김강민처럼 하기'가 무척 어려운 게 문제다. 누군가의 귀감이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AL 지명타자 부문 현재 1위는 오타니다. 117만4069표를 얻어 2위인 보스턴 레드삭스 J.D. 마르티네스(53만660표)의 2배 이상 득표했다. 투타겸업을 하면서도 타율 0.272, 23홈런 54타점 10도루의 엄청난 활약 덕택이다. 홈런은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토론토)와 함께 공동 1위. 생애 첫 MLB 올스타 출전이 유력하다. 오타니는 홈런 더비에도 출전한다. 투수 등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